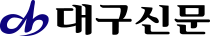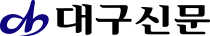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공부나 숙제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었고 해방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남편이 호열자(콜레라)로죽자 관도 없이 거적말이로 묻은 후 호열댁이라는택호가 붙어버린 홀어머니와 처녀티가 날락 말락하는 누나와 함께 내외술집(주모가 손님과는 대면하지 않고 샛문으로 술상만 넣어 주는 술집)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으며 월사금(매월 수업료)은 아예 낼 생각도 안 했고 오입(가출)도 몇 번 갔다 왔으며 공부하고는 열촌도 넘은 녀석이었다.

“애-또 배꾸영(배꼽)시계를 보이 인자부터 저임(점심)시간이다. 느그너이는(넷은) 새기(빨리) 털보네 밭에 가서 굵단한 감자 다섯 개씩만 얌생이질(도둑질) 해가 온나, 그라고 요새 피난민들 때문에 털보가 밤낮으로 지킨다 카이, 망 잘 보고 단디(실수 없이)해라.” “권땡땡이 집 능금 밭으로 돌아서 들어가면괜찮다.” “그쪽으로는 안 된다, 그 집 개가 얼마나 무서운데.”“그라마 오리웅덩이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마 안되겠나?”“거기도 오리 키우는부랑쟁이 할배, 할매 때문에 안 된다.”“한번 죽지두 번 죽겠나, 일단 한번 가보자.” “그런데 호진이는 와 안 가는데?”하고 한 놈이 자못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장에게 물었다.
“야 임마, 호진이는 급장 아이가, 급장이 우예얌생이질을 하노, 느그 퍼떡(빨리) 안 갔다 올래?” 하고 손을 올려 들자,“깝치지(재촉하지) 마라, 갔다 오마 안되나.” 하고 넷 놈은 부은 얼굴로일어서며 바짓가랑이를 묶어 자루를 만들어 감자를 캐러 가고 나는 큰물에 밀려온 나뭇가지들을주워 모아 모닥불을 지필 준비를 했다.
대장이 벗어놓은 바지를 뒤척이더니 성냥을 꺼냈다. “애들이 오거든 불 피우지 와 하마(벌써)피울라 카노?”하고 물었으나 내 말에는 대꾸도하지 않고 멋진 폼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고, 나는너무 놀라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니도 한번 빨아 볼래?” 했다.
나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어른들이 볼까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나 그는 태연히모래언덕에 비스듬히 누워 동그라미까지 만들어가면서 멋지게 담배연기를 뿜어댔고 나는 경탄에경탄을 금치 못했다.
흐르는 강물에 담배꽁초를 내던지며`에이 씨팔’ 하는 대장의 눈에는 어느덧 이슬이 맺혀 있었고 나는 영문도 모르고 숙연해지며 그의 눈치만 살폈다.
“양식이 떨어져가 엊저녁부터 굶고 한대 피웠더니 대가리가 팽 돈다.” 하면서 모래 바닥에 얼굴을 묻는 것을 보고 그 밑구멍이 찢어지는 보릿고개의 고된 삶을 익히 알고 있는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기와 슬픔을 되삼킬 뿐이었다.
우리집도 사흘이 멀다하고 달이 뜬 죽 그릇이 올라오지만 오늘저녁은 대장과 함께 먹기로 속다짐을 하며 감자서리를 하러간 아이들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자슥들은 영천장에콩팔로 갔나 와 아직도 안오노, 배고파 죽겠구마는…”하고 대장이 혼잣말로투덜거리는데 저만치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른 주먹만한 감자 스무 남 개를 쏟아놓자 대장이 물었다.
“감자 마이 있더나?” “그래, 천지 삐까리더라(엄청나게 많더라).” “무리(오이)는 없드나?”“와 없어, 무리도 새 비럿더라(많이 있더라).”“야 이자슥아 그라마 무리도 따 와야지, 감자 묵을때는 무리하고 같이 묵어야 목이 안 멕히지 이 버구(바보) 같은 새끼들아.”놈들은 뒤통수를 긁적이며 미안한 표정들을 지었다.
“이와이(조생종 사과)라도 좀 따오지 와?”“덜익은 거 몇 개 따오다가 큰놈들한테 뺏겼다.”“언놈들인데, 문디(문둥이) 콧꾸영의 마늘을 빼 묵지 개새끼들…”“잘 모리겠더라, 말 하는 거 보이피난민 아 들이지 싶으더라.”“깡다구는 좀 있어보이더나?”“깡다구는 무슨 깡다구, 꼬라지가 꼭염(죽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일)하다가 놓친놈 같던데.”“야 이 하찌(팔푼이)들아 그라마 능금은 와 빼앗겼는데?”“덩치가 대장보다도 더 큰기 두 놈이나 되니까 할 수 없이…”“나중에 누군지 알아보고 정식으로 한판 뜨자 케라.”감자가익어가자 대장은 신문지에 싼 사카린과 소금을내 놓았다.
우리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고역시 대장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얼굴이 검정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먹어댔고 나는내 몫인 감자 한 개를 대장 앞으로 미루어 놓았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