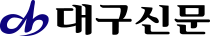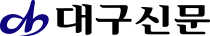한민족사랑문화인협회
작가회의 공동의장·시인
나 자신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너들 잘 되라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이지 공부해서 부모 주나? 부모는 죽으면 그뿐이다’ 또는 ‘좋은 친구를 사귀라. 나쁜 친구 사귀면 안된다’ 등 많은 밀씀들을 애타게 해 왔던 걸로 기억된다.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도 있잖은가.
그래서 커서는 잘 된 자식도 있고 못 된 자식도 있지만 부모가 세상을 뜰 때쯤이면 늦었지만 그때서야 한탄하며 팥죽같은 눈물 뚝뚝 흘려봤자 돌아가신 부모는 말이 없다. 대체로 이게 우리네 전형적인 지난 날 삶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 부모들은 글자도 모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식들 훈계할 때는 공자님 말씀이나 맹자님 말씀 같이 조금도 틀림이나 어긋남이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는가. 만물의 이치처럼 부모들은 가정을 꾸리며 살아온 생계가 전부였기에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구어도 책을 보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했어도 빈틈이 없었다.
이렇게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일상에서 이루는지는데 부모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시사철을 흙 묻히며 살아왔던 것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그러니까 진달래꽃이나 살구꽃이 지고 녹음이 온 산천을 물들이는 무더운 여름이 되었다는 말인데 들에는 모 심어놓은 무논에 벼가 익어가고 집앞 남새밭에는 오이넝쿨이 재주를 부리는듯 울타리를 타고 오르며 보란듯이 자식같은 푸른 오이를 주렁주렁 매단다.
동네 어귀 오래된 고목의 느티나무에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입이 째지도록 매미가 울어댄다.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어디서 들어 알고서 인생을 한탄하는 것인지,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되기에 최선을 다해 눈 감는 날까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느티나무 그늘 아래 놓여있는 넓은 평상 위에 더위를 식히는 동네노인들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드는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해 주는 역할도 한다. 여름날의 매미소리를 시끄럽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으니까 말이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백성일시인의 시 <어머니의 부채바람>이 생각나는데 역시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 주는 풍경 같아 소개한다.
삼베적삼 우아하게 차려 입고/ 둥근 부채 들고/ 삼복 더위 몸으로 막으며/ 이마에 포도송이같은 땀방울이/ 둥근 부채바람에 자맥질한다// 모듬내 다리 밑에서/ 바람들이 동무하여 몰려오고/ 매미소리 베게 삼아/ 늙은 아들 코 고는 소리// 부채질하는 어미는/ 아주 오랜 예전의/ 지아비 모습 떠올리며/ 하나 둘 떨어지는 땀방울이/ 행여나, 늙은 아들 얼굴에/ 떨어질세라 조심스럽다// 어미의 찌든 얼굴이/ 그새 호박꽃처럼 환하다
한 편의 시에서 절창이란, 비유가 멋있어야함은 물론 찰진 맛까지 나는 법이다. 이처럼 어머니도 늙었고 아들도 나이가 들어 늙은 나이인데 이런 진풍경을 보니 착한 아들이거나 부모걱정 별로 안 시켜드린 아들 같아 흐뭇하다. 또 그냥 동네노인들이 모여 더위를 식히는 풍경 그 자체를 읊은게 아니라 늙은 아들이 등장해 신선함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채질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 시에서는 늙으신 어머니가 자고 있는 늙은 아들에게 부채질을 해 주고 있으니 더욱 모자지정 (母子之情)의 뜨거운 혈육이 느껴진다.
이 작품속에서도 흥건이 젖도록 느낄 수 있는 것이 자식에 대한 모정(母情)이다. 어찌보면 지금은 찾을 수 없는 풍경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고향에 살고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식 키우며 도회지로 나가 먹고살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나이 들고 늙은 것 같은데 모처럼 더운 여름날 고향의 어머니를 찾아와 모듬내 개울 다리 밑에서 더위를 식히는 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아들이 낮잠 든 것 같다. 그것도 코까지 골면서 말이다.
이런 아들의 모습 보고 말은 없지만 어머니는 곤하게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부채질을 해주며 땀방울 하나라도 그 아들의 얼굴에 떨어질까 봐 염려하면서 자식들 먹여살리느라 고생이 많지……’라 했을 것이다. 자나깨나 부모는 자식걱정이라는 유행가 노래가사도 있듯이.
시인은 혼자만 알고 지내는 개인의 과거 추억담에 머물지 않고 한 편의 시로 써서 만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안겨주게 되었으니 시의 위대함 또한 여기 있고 보면 왜 시를 쓰는가에 대한 이해와 심정을 짚어보는 계기도 될 줄로 안다. 돈만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게 개인적으로는 퍽 행복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인(世人)의 가슴에 새겨지는 시 한 구절이라도 남긴다면 금은보화 보다 더 귀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