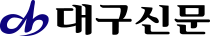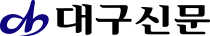자연요리연구가
성주 아소재 가는 길은 소풍 나선 마음과 달리 무겁고 답답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물건이 삶의 터전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거리 곳곳은 민심이 담긴 플래카드가 즐비하다. 이미 중앙 정부에 결정과 함께 지상에 발표한 상황이라 성난 주민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줄지 정부의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조율은 사라지고 오로지 통보만 난무하는 세상에 힘없고 무던한 농심이 견디다 못해 폭발했다.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에 주민이 몇이나 동의해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평생 욕심 없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 입장에서는 마른날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참외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대구근교의 귀농지로 주목받던 성주가 하루아침에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니 2차적인 피해가 주민을 더 힘들게 한다. 통하지 않고 막혀있는 중앙 정책이 막막한 여름 더위만큼 갑갑증을 불러일으킨다.
약간은 어둑한 마루에 앉아 뒤란으로 난 문을 내다보니 안의 풍경이 뒤란 밖 대밭풍경을 집안으로 끌어들인다. 액자 같은 문틀 너머의 환한 빛은 초록은 초록답게 하늘은 푸르게 밀어 올린다. 툇마루에 등을 기대고 앉아 마당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내 어깨를 치고 뒤란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무심히 지켜본다. 추녀를 서성이던 구름도 아래채 모서리를 돌아 다시 위채를 돌아 나간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기가 흐르는 집은 오랜 세월에도 살아 꿈틀거린다. 본채 아소재와 양옆으로 성우당과 소미재가 함께 어우러지니 더 돋보이는 집이다. 기둥하나 서까래 하나 따로 놀지 않는다. 있어야 할 곳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상생의 관계다. 덩그러니 한 채만 있는 것보다 서로 비바람도 막아주고 어깨동무하고 서 있는 것 같아 보기에도 그만이다.
사방팔방 기가 넘나드는 집처럼 세상 밖 일도 서로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갈등이 사라진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못 되지만 매사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세상도 바람직한 세상은 아니다. 수직구조의 세상이 수평구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일과 일 사이에 높게 막힌 벽도 뚫어야만 세상이 건강해진다. 한창 농사일에 바빠야 할 농민이 서울로 줄지어 올라간 이유는 뭘까. 가장 낮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를 중앙에서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난 사람들의 말 보다는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무엇이 잘 못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다.
툇마루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 여러 푸성귀를 쪄 막장에 싸 먹는다. 오물오물 한 입 밥을 먹으며 하늘도 보고 마당 넘어 먼 산도 보고 주인장의 성품도 살핀다. 집과 사람은 은연중에 닮는지 너른 마당만큼 주인장의 도량도 넓어 보인다. 싸간 찰밥과 여름 찬을 챙겨주니 금방 연잎 밥 한 덩이 내온다. 깻잎 한 장에 밥 한 덩이씩 올려 먹으며 정(情)도 함께 먹는다. 주인장의 덧대지 않고 보여주려 애쓰지 않는 본성 그대로의 모습은 집만큼 편안해 보인다.
성성한 댓잎이 쏟아진 뒤란 문틀 앞에 잠시 머리를 두고 누워 본다. 하늘도 거꾸로 흘러가고 추녀 아래 거미집도 훤히 보인다. 앉아 보이지 않던 풍경이 새삼스럽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소재에서는 가장 큰 사치라더니 그 말이 맞다. 부디 성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무탈하기를 빌며 부용화 핀 길을 돌아 나올 때 집 밖 세월은 한 백 년이 흐른 듯 아득했던 여름 오후. 칠월 한나절이 뭉게뭉게 흘러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