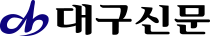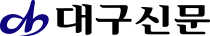국민정치경제포럼
물론 귀중한 것을 겹겹이 싸고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만큼의 겹옷이 필요한 것이다. 용도를 넘어선 겹옷은 제 몸과는 다르게 겉돌아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 과거에 우리네 정서는 예를 존중하여 상대방의 본심보다 나의 예를 다 갖추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거절은 진심이었는데 이쪽에서 보기엔 겸손의 미로 여겨 기어코 마다하는 손길을 뒤로하고 나의 호의를 받아달라며 떠안겼었다. 그러한 면면이 지금도 사회 전반에 스며있다고 할까 한두 번의 거절은 당연 절차로 여기고 나의 호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솔직한 속내를 내보이는 것보다 상대의 체면과 나의 체면을 앞에 명목상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의도적인 예에 치인 덕분이다.
이는 한편에서 볼 때는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생각하여 예를 갖추는 모습이 꽤 곱게 보인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볼 때는 서로의 진심을 내놓지않고 예로서 대하고 예로써 인사를 하니 아무리 만나도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이가 된다. 필요에 의해 예를 갖추고 대화하려고 찾아오기는 하겠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찾아오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이든 일반사람이든 다가가는 것에 껄끄러움이 없어 보인다. 처음 만나는 사이에도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로 쉽게 안면을 튼다. 그리고 체면치레의 이야기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남녀노소가 지위나 나이의 갭을 두지 않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 소통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길가다가 만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대화를 나눈다 해도 처음부터 몇 살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하며 갭을 만드는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네 문화는 과거와는 분명 달라졌다. 어른을 공경하는 등 미풍양속을 이어가려고는 하나 정체성과 문명 발달의 지체 속에 우리문화의 색깔을 잃어 버렸다. 바래진 색을 들고 과거를 고수하려는 노년층과 저만의 색깔이 소중하다는 젊은층은 현재의 문화를 인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회전반에 충돌 요소가 상존하고 작은 잡음으로도 쉽게 실갱이가 돼 경찰이 출동한다.
사회 전반의 불편한 소통은 국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을 대표해 우리 지역을 달라지게 할 것이라며 밀어달라고 나선 국회의원들은 그 짱짱하던 목소리가 본진에 합류하면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다. 제 색깔에 본진의 색깔을 물들이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정쩡함으로 모여 있어 밖에서 볼땐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모두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 돼 기대치를 벗어난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 자신의 색깔을 알고 이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색깔을 바꾸며 동조하는 사람은 이랬다저랬다 바꾸는 색깔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 버린다. 스스로를 자부하는 정체성이란 어느 색깔 속에 있어도 고유성을 가져야 그 진면목이 빛나는 것이다.
2016년 현재라는 말이 무색한 최순실사태의 아수라장 속에 흔들리는 국정을 보니 구중궁궐의 임금님이 보인다.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아닌 과거 속에 정체된 듯 겹겹이 싸여 현재진행형의 소통이 부재했음이 보인다. 과거의 정체성이 아닌 현재의 변화를 통한 진화를 이어가고 있었다면 눈앞에 놓고도 믿을 수 없는 오늘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겹겹이 싸여있는 임금님은 궐 밖의 세상을 몰랐고 측근의 예를 갖춘 신하들은 마음은 쏙 빠진 채 예만 다했다. 예의를 갖춘 만남은 경쾌할 것이다. 그러나 진심이 빠졌다면 천번의 만남도 의미가 없다. 때문에 의전을 갖출 수는 있지만 마음이 통한 의견일치를 가져오긴 어렵게 된다. 사람은 없고 그 자리만 있는 모양새로 그 사람의 색깔을 만날 수는 없게 된다. 우리는 자리보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