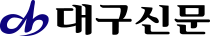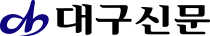이파리들이 허물어지며 그늘진 풍경을 따라 한참을 걸어 다녔어 수많은 길들이 웅덩이 속으로 고이고 가끔은 단단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지 얕은 바닥에는 주름처럼 오그라든 기억들이 앉아 있었어(누가 웅덩이가 얕다고 했을까) 퇴적암보다 오래된 먼지 속에서 희끗한 수포를 수없이 내뿜으며 부유물처럼 가라앉고 있는 슬픔들을 줍고 있었지 어느 빗물이 흘린 슬픔인지 눅눅한 벽에 기대어 밤늦도록 춥고 흐린 가로등의 눈물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골목길이 허공처럼 부르르 떨며 안아보았던 한기인지 여름도 아니었고 겨울도 아니었지 늘 오는 삶의 한 귀퉁이에서 목마르게 달려든 것 너무 많은 그늘들이 허공 속에 엉켜있었던 거야 바람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었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목소리, 들리지 않는 울음 같은 것이었어(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낙타의 커다란 두 눈이 생각나 막막한 두 눈이 어쩌자고 사막 한 가운델 보고 있었는지 등에 짊어진 혹은 또 얼마나 깊이 쌓여 있었는지 아아 나는 모르겠어 낙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모르겠어)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길들이 웅덩이를 만들고 가끔은 웅덩이 속에 울음을 쌓아두는 거야 그늘 속에선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김성우 1966년 경북김천출생 낮은 시 동인. 한국시민문학협회 회원 현) 한시문협 이화세계문학 연구위원 시집: 새벽3시에 대하여 (1993년)외 5권.
<해설> 웅덩이가 주는 두려움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웅덩이가 바닥을 드러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면 더 이상 웅덩이가 아니다. 웅덩이는 수 많은 부유물로 인해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야 한다. 웅덩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흔이다. -김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