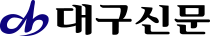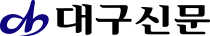관광·휴양 동시에 즐기는 향락의 도시
포르투갈 식민지 탓 상당수 가톨릭신자
1월 초순에도 곳곳 크리스마스 분위기
육고기 거부감 없어 짜장밥 함께 먹어
석양 바라보며 홀로 바닷가 거닐 때
내면의 소리 들으며 진정한 여유 느껴

‘남인도는 북인도랑 또 달라서 관광이랑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지. 낮엔 해수욕을 하면서 맛있는 열대과일을 먹고, 저녁엔 방안에 누워서 느긋하게 일몰을 감상하는 거지. 어때, 환상적이지 않아?’
북인도 어귀에서 만났던 동행의 말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릭샤의 경적소리와 거지들의 구걸에 지쳐있던 내게 그가 자랑처럼 늘어놓은 남인도 경험담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좋아. 남인도에서는 먹고, 자고, 놀고 아주 제대로 즐겨보는 거야. 으흐흐!’
하지만 이런 내 기대는 채 반나절을 가질 못했다. 왜냐면 기차가 남으로 남으로 내달릴수록 기차 안이 뜨거운 찜통처럼 푹푹 찌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뭐야..더워 죽겠네...”
침대칸에서 세상모르고 잠에 빠져있던 난 갈수록 숨통을 조여 오는 뜨거운 공기에 오만상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북인도에서 내내 입고 있던 긴팔 티셔츠가 땀에 절어 온몸이 축축했다. 자는 동안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온 얼굴에 머리카락이 다닥다닥 붙어있을 정도.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아 발치에 놓아두었던 생수통을 집어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반나절 사이에 물이 뜨끈뜨끈해져있었다.
‘와, 뭐야. 날씨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닌데? 이래서야 어디 여행하겠어?’
그렇게 살인적인 더위와 싸우기를 몇 시간, 마치 드라이기를 입안에 물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낸 결과, 나는 드디어 휴양의 도시, 남인도 고아(Goa)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고아는 인도양을 끼고 있는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해안 지역이다. 이곳은 1510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후, 약 450년간 포르투갈과 동양 여러 나라 사이를 이어주는 무역의 중계점 역할을 해왔다. 고아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답게 소금 및 각종 어류를 비롯, 코코넛 열매와 열대과일 등을 무궁무진하게 생산한다. 고아는 1961년에 인도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오랜 기간 포르투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탓에 거주민의 상당수가 가톨릭 신자들이다.
사실 고아에 도착했을 때 까지만 해도 나는 고아의 역사라든지 종교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어차피 인도야 워낙에 모시는 신이 많은 나라이니 어느 지역을 가든 다양한 종교들이 있을 테고, 남인도 고아 역시 내가 익히 접해왔던 힌두교, 이슬람, 자이나, 불교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그건 나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뭐야 저거? 설마 크리스마스 트리인거야??”



앞서 설명했듯이, 고아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지역이라 각종 놀거리, 먹을거리 등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잔잔한 파도와 눈이 아릴만큼 눈부신 에메랄드 빛 바다는 쳐다보기만 해도 그 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고아는 인도 내 향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만큼 해안가 쪽이 상당히 시끌벅적한 편인데 내가 묵었던 베나울림(Benaulim) 비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시골 어촌마을 같은 분위기라 파티 분위기를 싫어하는 여행자들에겐 안성맞춤이다. 사실 나 역시 음주가무를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안주나(Anjuna) 비치를 일부러 피했는데 덕분에 고아에 머무는 내내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고아에 머무는 동안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해질녘 석양을 보여 바닷가를 거닐었던 때. 촉촉이 젖은 해안가를 맨발로 사박사박 거닐며 그 풍경 속에 가만히 섞여 있다 보면 굳이 구슬픈 음악을 듣지 않아도 머릿속에 오만가지 감정들이 스쳐지나갔고,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지 않아도 그간 흘려보냈던 나의 수많은 어제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간 살아오며 했던 수많은 고민들, 애써 외면해버렸던 나의 현실들, 그리고 한국에 두고 온 이들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온통 물음표 투성이인 나란 인간의 미래까지. 그렇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홀로 바닷가를 따라 타박타박 걷다보면, 어느새 눅눅했던 공기가 서서히 가시고 꽤나 산뜻한 저녁 바람이 머릿가로 살랑살랑 불어오곤 했다.
그렇다. 내가 고아 베나울림에 머무는 동안 했던 일이라곤 딱히 특별할 것이 없다. 델리에 있었을 때처럼 맘껏 쇼핑을 한 것도, 바라나시에 있었을 때처럼신적인 무엇가에 푹 빠졌던 것도, 아그라에서처럼 관광을 살뜰히 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고아 베나울림 비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선사했고, 해질녘 저녁 노을 아래 앉아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끝없는 행복을 내게 건넸다.
만일 내가 앞으로의 삶을 살다 ‘나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나는 주저 없이 남인도 고아행 티켓을 끊고 베나울림 마돈나 게스트 하우스로 향할 것이다.
그래서 볕 좋은 테라스에 앉아 소고기가 잔뜩 들어간 짜장밥을 퍼먹으며 몇날 며칠 칩거를 한다거나, 혹은 20루피(340원)짜리 생수 한 병 사들고 하루 종일 해변을 걷는다거나 하는 ‘쓸 데 없는 일들’들로 하루를 알뜰하게 탕진할 것이다. 혹시 또 아나,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나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보면, 언젠가는 이 인도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해답’들을 배낭 안에 가득가득 챙겨 넣어줄지.
남인도 고아에서의 나의 하루는, 그저 이러했다.
여행칼럼니스트 jsmoon09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