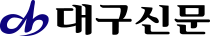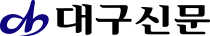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고양이 출입 금지, 문단속 철저히”
방방곡곡 눈이 쌓여 설국의 풍경을 연출한다는 기상청 예보가 연일 쏟아진다. 한파와 동파, 냉해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함께 이어진다. 하지만 행간 어디에도 거리 두기를 해제한다는 문구 한 줄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세상을 읽는 일에 게을렀던 건 아닌지 돌아본다. 소설가 파올로 코엘료는 ‘두려움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무력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마스크로 가렸다는 핑계로 그 너머의 눈빛에 어떤 감정이 담겼는지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은 마음의 이면을 읽어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주변의 눈을 피해 숨겨두었던 길 고양이의 밥그릇을 마당 한복판으로 끄집어낸다. 밥그릇은 바닥을 보이고 흔들리고 있는 이가 시릴까 봐 따뜻하게 데운 물을 부어준 물그릇은 한파에 꽁꽁 그릇과 함께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다. 몇 해째 나와 함께 집 안과 집 밖으로 나뉘어 동행 하는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이웃이 된 지 오래다. 밥알을 씹어 먹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며칠 못 본 사이 배가 부른 듯하다. 걱정이 불을 지핀다. 애가 타들어 간다.
참치 캔 하나를 들고 와 길 고양이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오랜 시간 보아왔음에도 단 한 번 경계를 풀지 않았던 그가 웬일인지 캔 속으로 고개를 떨어뜨린다. 침 튀기듯 떨어져 나간 한 점까지 혓바닥으로 샅샅이 훑어 먹는다. 바닥의 먼지들도 함께 입안으로 쓸려 들어간다. 연신 눈치를 살핀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그의 눈빛이 따라 흐른다.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는다. 맞은편에 쪼그려 앉은 나는 발에 난 쥐를 쫓아내느라 코에 침을 몇 번이나 찍어 발랐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일어설 수 없었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그를 해치려 드는 것인 줄 오해하고 멀리 달아날까 봐 두려웠던 까닭이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꼬리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얻어먹는 눈칫밥이라 할지라도 캔 하나를 다 비우는 동안만이라도 속이 따뜻했으면 하고 바랐다.
가끔 시멘트나 페인트가 덧칠해진 의자나 길 위에 ‘지나가지 마시오!’라고 쓰인 경고문 아래 선명하게 찍힌 새나 고양이들이 남긴 발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경고문을 읽을 줄 모르는 그들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또한 그들에게도 지분이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곤 한다. 모두가 같은 시선일 수 없고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다. 해석에 따른 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 같이 한 마음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로 모두를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고양이 발자국 하나에 세상을 배워가는 순간이다.
일 년 중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그 동지가 오늘이다. 그리고 그 길다는 밤이 지금이다. 길어진 동지의 어둠만큼이나 길 고양이의 시린 밤도 길어질 테다. 하지만 오늘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은 내일부터는 밤이 짧아지는 것이며 그 짧아지는 만큼 해가 점점 길어진다는 것이다. 응달과 양지가 외줄 타기처럼 기울기를 반복한다. 균형을 잡기 위해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세상사처럼.
세심하게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십이월의 저녁이다. 세찬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려 있는 나뭇잎들에서 질긴 생명력을 본다. 창고 뒤에 웅크리고 있는 보일러가 기름이 바닥이라며 타전을 친다. 숲도 사라지고 없는 도시에서 혹한이 밀려든 겨울밤이면 길 고양이들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추위를 견디곤 한다. 기름보일러 대신 도시가스로 모두 바뀌고 있는 세상, 길 고양이들의 따뜻한 잠자리도 사라져가고 있다.
밥그릇과 물그릇에 밥과 물을 채워주지는 못할망정 일부러 발로 차거나 물그릇에 담뱃재를 떨거나 침을 뱉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본다. 가난한 사람에겐 여름보다 겨울나기가 더 힘들고 고단한 일이라는데….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