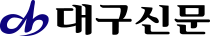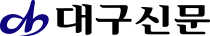시인
신혼 시절, 겨울비 내리는 늦은 밤이면 퇴근 시간에 맞춰 버스정류장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가곤 했다. 한 손엔 우산을 받쳐 들고 또 다른 한 손은 그의 호주머니 속, 깊숙이 찔러 넣는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은 옛 추억 속에만 들앉아있다. 호주머니 속에서 한데 섞여 맞잡은 손의 온기는 지금껏 식지 않고 남아 지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곤 한다.
집 앞을 산책하거나 짧은 외출을 할 때면 호주머니의 활약은 한층 더 대단해진다. 가방을 따로 들지 않아도 휴대폰이나 열쇠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호주머니 속에 챙겨 넣고 슬리퍼를 끈 채 동네 한 바퀴 정도는 홀가분하게 돌아올 수 있다. 맨손으로 가볍게 걷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다.
세월은 돌고 돈다. 사춘기 지나 사추기가 오듯 아들은 객지로 딸아이는 결혼으로 출가시키고 나니 신혼지나 다시 신혼을 맞았다. 내 방 하나 가졌으면 소원하던 꿈이 있었지만, 자가용이 생기면서부터 마중을 나갈 일이 필요 없게 된 것처럼 지금은 마음도 방도 모두 빈방이다. 소란하던 방과 방 사이가 멀어진 채 고요에 잠겼다. 둘만 남아 더욱더 가깝게 있어야함에도 정작 그와 나의 거리는 신혼 때처럼 쉬이 돌아가지 않는다.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는지 늘 걱정이 앞서 달려 나간다.
호주머니라는 단어 속에서 호주(戶住)는 머니(money)를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게감이 느껴진다. 시시포스처럼. 진로도 퇴로도 없는 가장의 길, 그 고단한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희생으로 치러진 대가 위에 가족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음을 가장의 명예며 자존심이라 여긴다. 남편은 나의 호주다. 호주는 한 집안의 가장이며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사람, 즉 주장이다. 수의에는 없는 호주머니처럼 나의 호주는 늘 머니가 없다고 말한다. 늘 비어있다. 뒤집으면 먼지만 나온다는 시늉을 하곤 한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 꿈을 억누르고 사는 그는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된다. 기승 전, 돈이다. 옷 한 벌 외식 한 번 하자는 말에도 자신을 위한 일이면 그게 뭐든 '돈 없다'는 소리부터 일단 하고 본다. 그에 비해 아내인 나나 자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면 뭐든 주머니를 탈탈 털어 무조건 들어준다. 가족들에겐 호의적이며 뭐든 다 해주지만 자신에겐 인색한 그가 짠하다. 사람 마음이란 게 별반 다르지 않아 호주가 잘되고 행복해야 덩달아 가족인 우리가 몇 배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는 늘, 자신은 아무래도 괜찮다고만 한다. 김형석 교수의 '백 년을 살아보니'에서 말한 것처럼 나 역시 백 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인생 고개 반을 훌쩍 넘고 보니 적어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치를 반 이상은 알 것 같다.
돌아볼 새 없이 한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결혼 전 그의 꿈은 뭐였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딸내미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보낸 후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내 꿈은 세계 일주를 해 보는 것이었지'라고. 살아가는 가치를 물질적 가치에만 둘 수 없다. 정신적 가치라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지금부터라도 가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로부터 빠져나와 머니가 아닌 방치하고 짓누르고 있던 자신의 꿈을 호주머니 속에 조금씩 채우고 살기를 바라본다.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함께 나누고 살아야 할 둘만의 노후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호주머니가 달린 옷의 또 다른 매력은 어쩌면 시간을 품는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봄이 와 겨울옷을 정리하다 말고 주머니 속에 숨어들어가 사는 나팔꽃 씨앗 한 줌을 발견했다. 오래전 그와 함께 집 근교에 있는 '마비정 벽화마을'을 다녀오던 중에 호주머니 속에 담아온 것이다.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마을 뒷산을 올랐다 내려오는 길에서 울타리 가득 피었다, 진자리에 품고 있는 열매를 따서 호주머니 속에 넣어 왔던 추억을 소환한다. 나팔꽃 씨를 빈 화분에 심었다. 봄비가 내리고 새싹을 틔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한 줌도 함께.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