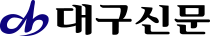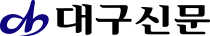한적한 호수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러운 망상이 바닥으로 침잠
욕망의 찌꺼기들 말끔히 씻겨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화
대구지역 저수지 199개
대부분 농업용수 공급 역할
택지개발에 농지 사라지면
목적 잃은 저수지도 사라져

“지구의 표면에서 호수처럼 아름답고 순수하면서 커다란 것은 없으리라. 하늘의 물, 그것은 울타리가 필요 없다. 수많은 민족들이 오고 갔지만 그것을 더럽히지는 못했다. 그것은 돌로 깰수 없는 거울이다. 그 거울의 수은은 영원히 닳아 없어지지 않으며, 그것의 도금을 자연은 늘 손질해 준다. 어떤 폭풍이나 먼지도 그 깨끗한 표면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콩코드 마을 인근에 있는 월든이라는 이름의 호수를 바라보며 쓴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글이다.
맑은 물 표면은 때가 되면 바람이나 비가 씻겨 주고 언제나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거짓 없이 보여주는 청정한 거울이다. ‘돌로 깰 수 없는 거울이다’라는 표현에서는 그 절정을 이룬다. 백년도 넘는 시간을 되돌려 우리가 이 호수를 바라보았다면 아마 소로우와 비슷한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있지 않을까.
도심을 벗어나 어느 계절이든 한적한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전쟁과 같은 다난한 사회의 시기와 질투에 자신도 모르게 번롱당했던 수많은 어지러운 망상들이 호수 바닥으로 침잠하는 것을 느낄수 있는데 주말마다 습관적으로 떠나는 낚시꾼들의 낚시 행위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내가 가끔씩 찾아가는 대도시 인근의 호수인 도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아침 안개가 채 걷히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옅은 먹구름 사이로 진주빛 하늘이 살짝 보일 즈음 나는 느티나무 보호수(保護樹)의 근황을 알아보려 차를 몰고 바로 보호수 인근에 있는 호수로 먼저 향했다. 호수는 북쪽의 도덕산 정상에서 갈라진 계곡의 물이 모여 형성된 크고 작은 호수 중에서 가장 넓은 호수로 이날 따라 바람은 거의 없는 날씨 탓에 못둑에서 바라보는 호수에는 갈색 산그림자가 거울에 비치듯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 속의 산이 진짜인지 하늘 아래는 똑 같은 두 개의 산이 하늘과 물 속에서 서로 마주보는 맑고 투명한 호수 속으로 나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아침 시간이라 아직 물안개가 간간히 피어오르고 둑 한가운데 어느 지점에 약간은 두터운 검은색 외투에 흰색 모자를 쓰고 조용히 낚시 찌를 바라보는 사내가 눈에 띈다. 마치 신선이 호수의 물고기와 바람과 안개와 물풀들을 불러 모아 조용히 아침 회의를 여는 듯 신비롭기까지 했다. 나는 물결이 일지 않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못둑 위에 핀 결초보은의 수크령의 전설을 생각하며 그 군락을 향해 조금씩 둑 위를 걸었다. 한여름의 하얀색 꽃은 어느덧 갈색 머리의 중년이 되어 일제히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풍성한 몸매의 알이 찬 그령의 꽃대를 만져보면 마치 고양이 꼬리를 만지는 듯 부드럽고 매끄럽다. 호수가 만들어질 당시 물이 있는 곳의 둑 안쪽은 모두 크고 작은 호박돌과 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과 돌 그리고 갈풀들이 어우러진 이곳에는 어디 물고기만 있으랴. 파충류 중에서 뱀은 주로 돌이 많은 산과 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는데 둑 안쪽 돌들의 틈사이에는 분명 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찬찬히 둑 바닥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걷게 된다. 무성한 풀이 주는 알 수 없는 공포심이 아직도 인간의 뇌리에 남아 있듯 깊은 산 속의 검은 숲은 인간의 공포를 아마 더욱 크게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못 둑에 서서 호수 한 가운데를 바라보니 갈풀로 덮힌 작은 손바닥 만한 섬이 보인다. 섬이라기보다 홍수에 떠내려 온 커다란 한 무더기의 흙더미가 풀뿌리와 함께 밀려와 호수 한 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자세히 보니 다행히 물을 좋아하는 갈대와 보라색 열매를 달고 있는 여뀌 한 가족이 이사를 온 듯 호수 한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데 그 작은 왕국에서 키가 큰 갈대는 당당히 이곳 호수의 물을 지배하는 우두머리 같아 보였다. 손바닥 만한 작은 섬을 한동안 응시하다 보면 호수에 돛배라도 띄워 아직 잠들어 있는 물고기를 흔들어 깨워 그 작은 왕국 주위로 노를 지느러미 삼아 그들과 함께 노닐고 싶어졌다. 바람이 일면 새들도 바람과 함께 날아올 것이다.
모두가 깨어 있는 호수 주변은 시들은 일년초를 제외하고 나무와 다년생 풀들이 한껏 늦가을의 햇살을 빨아들이고 있다. 해가 점점 더 달아 오르는 못 둑 위로 나는 우두커니 서서 나무가 되고 풀이 되어 본다. 어제 저녁 잠에서 털어내지 못한 욕망의 찌꺼기들을 이곳 호수에서 말끔히 씻고 가기 위해서다. 호수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화한다. 치유와 명상이 그렇고 맑은 물에 더러워진 우리의 육체를 씻는 일이 그렇다.
도남지의 물은 우리의 정신에 자양분을 주는 일 외에도 아직도 하구에는 많은 농지와 농작물이 있어 이들에게도 커다란 혜택을 주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도 함께 한다. 대구에는 199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다.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택지개발로 수많은 농지의 용도가 대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상부에 있던 저수지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수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성토(盛土)를 한 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다른 용도 즉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바꾼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속에 있던 저수지가 대부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호수는 지구의 눈망울이라고 어느 시인은 이야기 했다. 하늘에서 보는 세상의 크고 작은 호수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 속의 물이 맑고 탁함을 떠나서 말이다. 오래 전부터 맑은 물과 샘터가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듯 택지개발 중간 중간에 작은 호수 하나쯤은 우리의 곁에 남겨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호수가 있었다면 말이다. 그것이 새로운 물의 친수 공간이 되든 아니면 호수 옆 공원에 새들이 모여들고 호수 둘레길을 산책하는 낭만어린 공간이 되든 우리는 호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다. 사진으로만 보고 가보지 못한 곳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러시아의 바이칼, 남미의 티티카카 그리고 혁명가 체게바라가 ‘혁명 따위는 때려 치우고 이곳에 살고 싶다’고 했던 과테말라의 아띠뜰란 호수는 살아 생전에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다. 내 고장 대구에도 아름다운 호수가 많다. 도심을 약간 벗어나 있는 도남지를 비롯하여 몇 몇 생태 호수, 송해공원의 옥연지 등 특히 도심속 한 가운데의 수성못은 과거 농업용수로 사용했던 저수지였으나 지금은 호수 주변을 다양한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여 계절별 볼거리를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섬에는 백로의 휴식처로 밤이면 하얀 백로 떼가 사방 환한 불빛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잠을 청하는 안식처다. 불빛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조류의 생태 특성과는 달리 이곳 백로는 오히려 인공의 어지러운 불빛을 즐기는 것 같다. 변화된 생태 환경에 백로가 잘 적응 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호수와 그리고 나무와 풀들로 이루어진 수성못은 이용자의 수에 비해서는 좁은 편이다. 환경과 생태에 반하는 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수성못이 대구의 친수 공간 중에는 최고의 유원지가 되고 있다. 도원지가 있는 월광수변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호수의 나라다. 유역이 깊고 비슬산 줄기인 청룡산과 과비산 계곡 물줄기가 모여들고 수원이 멀어 꼬리가 길게 만들어진 모습이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고래가 끊임 없이 물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인류가 탄생한 숲의 기억을 더듬어 해안선처럼 긴 호수의 둘레길을 반바퀴쯤 돌고 나면 송봉과 담봉 삼필봉에 이어지는 비슬산 둘레길로 들어선다. 호수를 둘러안은 산은 어머니요 도원지는 마치 온갖 생명을 품고 있는 양수 주머니와 같아서 고래는 잉태한 모습으로 이곳 사람들과 땅에 끊임 없이 힘찬 생명을 불어 넣고 있다. 호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전설이 된다. 훗날 내가 그 전설처럼 포근하고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에서 살았노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이상의 꿈은 아니길 바라 본다.
임종택<생태환경작가·다숲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