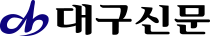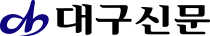나의 작품들 중 좋아하는 이 작품은 유학생활 당시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고독함과 역사가 만든 왜곡된 시선 아래에서 ‘진정 평등과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첫걸음으로 시작해서 완성된 시리즈중 하나이다.
이후에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에 젖어들어 붓을 들었고 울적한 페르소나의 울림들을 여러 오브제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 나는 그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내 그림이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
비단 그림을 그리는 도구나 수단, 기법 등 뿐만 아니라 삶과 그림의 경계마저도 허무는 것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고 그려내고 있다.
지금은 서두에서 언급한 ‘유학생활’ 때와는 달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박한 생활을 하며 시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좋아하고 작은 것에서 사랑의 기쁨, 감동, 전율을 느끼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곧 행동이 되니 생각들을 조심하며 rapport 형성 과정의 묘미를 깨닫는 것 또한 기꺼이 즐긴다.
동시에 삶에 인색하지 않으려 하고 배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으며 작품 활동을 한다.
누구나 살고 죽는것을 앎으로 멋진 성좌에 서로 앉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묘한 심리싸움을 끝으로 성좌를 차지하려는 세상에 물려서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작품세계로 빠져든다. 이제는 부질없는 것을 내려놓고 분열은 곧 하나에서 나온다는 통념을 토대로 누구나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담은 작품으로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