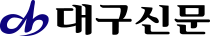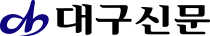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동박새의 노래, 꽃눈 뜬 매화…
새해를 맞이하는 불안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이 드리운다”
새해를 맞이하는 불안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이 드리운다”

갑진년, 용의 해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들이며 다들 용쓰지 말고 살라 한다. 용의 해만큼은 그리 한 번 살아보자 한다. 속는 셈 치고 그렇게 어디 한 번 버텨보자 한다. 또 누군가는 ‘밑져야 본전이니, 아니면 말고’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으로 삼는 이도 있었다. 무책임한 말인 듯싶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힘이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새해가 왔지만, 헌 달력 그대로 걸어 둔 지 몇 날이 지났다.
전당포에 맡겨둔 그 무엇처럼 형편이 나아지면 꼭 다시 찾으러 갈 거라는 다짐을 하듯 지난 시간에 발목을 묶어 둔 셈이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 두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출항을 앞두고 닻줄을 항구에 묶어둔 채 정박 중인 배처럼 애써 외면했다. 새해가 오기도 전 받아둔 새 달력은 방구석 어디쯤 밀쳐 둔 채로.
다시는 오지 않을 지난 시간이 애타게 그리워서가 아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간이 낯설고 두려운 까닭에 목이 멘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가지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동박새다. 그들의 노랫소리와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 위해 한파에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황금빛 햇살이 빈 가지들의 속을 켜켜이 채워 넣고 있다. 가지와 가지 사이 그 좁은 틈새로 이제껏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매화가 꽃눈을 뜬다. 내 눈 앞에 펼쳐진 그토록 환한 풍경이 마음을 열어 반갑게 새날을 받아들일 힘을 더한다.
볕 잘 드는 화단 한편에 네댓 마리 새끼를 품은 어미 고양이 가족이 몸을 말리고 있다. 저 한 줌 햇볕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껴본 이들은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겨울날에 느끼는 태양의 따뜻함(aprity)’을 이르는 영어단어가 떠오른다. 따로 지칭하는 말까지 있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해가 빨리 지는 시기, 오후의 햇살은 많은 것들이 시들고 쇠해버린 겨울 풍경에 희망을 더한다.
추위 속에도 따스함은 있고 허무 속에도 찬란함이 있다는 듯 그러니 안심하라고 겨울 햇살은 우리를 다독여 주는 것만 같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건 바람이 아니라 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도 한 줄기 햇살이 드리운다.
생각과 생각이 서로 눈치를 살피고 얽히고설키어 푸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엉키기 일쑤다. 별생각 없이 건넨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십상이다.
한 살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생이든 원고든 눈앞에 보이는 ‘마감 임박’이란 단어가 떠올라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 때마침 저녁밥을 차려달라며 그가 보챈다.
‘이런 날, 그 정도는 그냥 좀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될 걸….’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마음과 달리 몸은 지지고 볶고 데우며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잘 차린 밥상을 그 앞에 내어놓으며 끝내 다잡을 수 없는 서운함을 혼잣말처럼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다. ‘열두시가 마감인데 시간은 다가오고 글은 삼분의 일밖에 쓰지 못했는데….’ 그 소릴 들었는지 그가 대뜸 “시작이 반이라 캤는데 그만하면 다 쓴 거나 다름없네.”라며 별걱정을 다 한다는 위로를 건넨다.
“너무 용쓰고 살지 말자, 우리”라며 덧붙인다. 그도 나만큼 신경을 쓰고 있던 거란 걸 한 상에 마주 보고 앉아 밥알을 꼭꼭 씹어 먹으며 그제야 눈치로 알아차린다.제아무리 마감이라 해도 때가 되면 밥은 꼭 챙겨 먹고 하라는 다디단 쓴소리였다. 귀에 쓸수록 몸엔 좋은 보약 같은 말이었으며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쉼터 같은 당부였다는 것을.
외면했던 달력을 꺼내 벽에 건다. 겉장에 쓰인 “올해는 꽃길만 걸어용”이란 말이 한 눈에 들어온다. 묶였던 발이 풀리고 걸음마를 배우듯 한 발 한 발 천천히 발을 뗀다.
대문짝만하게 쓰인 그 말이 새해로 들어설 문이 되어 다시 나를 살게 한다. 슬슬 입은 닫고 귀를 열고 살라는 듯.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