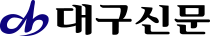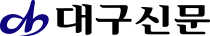시집간 딸내미가 집을 떠나며 저 대신 적적함을 달래라며 선물해 준 것이다. 겨울 속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안으로 들여야지'하며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 끝내 화를 불렀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손길을 더하고 마음을 다했더라면, 몇 걸음만 더 떼어 옮겨주었더라면….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 탓하고 보니 선인장의 주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살아있는 생물체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선인장에 차마 못 할 짓을 한 것 같아 후회와 반성이 파도처럼 인다.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의 선한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면역기능 수치가 크게 높아지는데 이를 두고 '마더 테레사 효과'라 부른다. '허리를 굽혀 섬기는 자는 위를 보지 않는다'며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데로 낮추어 인류애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사람으로 평생을 봉사와 사랑을 베풀며 헌신한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붙인 것에서 비롯된다. 의학적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긍정에너지인 엔도르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친다고 한다.
가시투성이인 다른 선인장에 비해 가시가 거의 없는 만세선인장이 서 있는 옆자리에 나팔꽃이 함께 뿌리를 내렸다. 밤을 새워 바람과 별과 달빛의 기운을 받아 새벽이면 화들짝 피었다가 아침이 다 지나가기도 전, 시들어가는 꽃이 나팔꽃이다. 둘은 서로 마주 보면서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외로움을 나눠 가졌을 게다. 비록 식물이긴 하지만 내가 만세선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삶의 일부분 안정감을 얻었듯 그들도 다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줄기를 뻗어 나팔을 불며 만세선인장의 어깨에 올라 무등을 타고 놀았던 것일까. 온몸을 칭칭 껴안은 듯 동여맨 그대로 바짝 메말라 있다, 씨앗을 품은 채.
섣달그믐, 정오부터 설날 아침 사이에 마을이며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복사세요, 복사'라며 복을 팔러 다니던 조리장수가 있었다. 그는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마당으로 복조리를 던져 놓은 후 나중에 복조리 값을 받으러 오거나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 받고 안 받고는 복조리장수 마음이었다. 지금은 쌀을 일 일이 없어 잊혀 가는 미풍양속 중 하나가 되었지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옛 시절의 훈훈한 인심이 그립다. 그렇게 마련한 복조리는 일 년 내내 방 한 쪽 구석이나 대청마루 한 귀퉁이에 걸어두거나 밥을 할 때마다 쌀을 이는 데 사용하곤 했다.
복을 지어야 복을 건네받을 수 있다. 금방 지은 따뜻한 밥을 내가 먹는 것보다 가족 혹은 누군가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 진한 심리적 포만감을 느낀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 복일 게다. 매 순간 보물찾기하듯 복 지을 일을 찾는다. 그중 하나가 밥 짓는 일이다. 복을 짓듯 밥을 짓고 복을 퍼 담듯 밥을 푼다. 복은 이처럼 주는 이와 받는 이, 그리고 지켜보는 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복으로 지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 '화'보다는 '만복'을 퍼트리고 다닐 테니까.
두류공원 지나칠 즈음 '사랑해 밥차' 앞으로 사람들이 가로수 길을 따라 길게 줄지어 섰다. 밥줄이다. 트럭에 새겨진 '사랑해'란 글귀가 해처럼 붉게 이글거린다. 세상의 모든 허기를 다 품어줄 것만 같다. 밥솥을 빠져나온 김이 한파에 터져 나온 저마다의 입김을 더해 모락모락 끓어오른다. 배고픔이 한계를 넘으면 뱃가죽이 등짝에 붙듯 등에 등을 붙이고 서 있다. 허기가 허기를 백허그(hug from behind)하고 있다. 수저통에 들앉아있는 숟가락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지 않고 모두 한 방향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아침 출근길, 벚나무 아래 떨어져 죽은 어린 참새를 만나면서 죽음보다는 외로움이 더 깊은 공포라고 느꼈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노인 자살공화국'이라 불리는 원인 또한 외로움과 배고픔일 게다. 배를 곯아보지 않은 이들이 마지막 잎새처럼 밥줄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허기를 헤아릴 수 있을까. 고봉으로 복을 퍼 담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민들레홀씨처럼 널리 널리 번져나가기를 바라본다. 허기가 마지막 남은 한 그릇 허기를 마저 데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