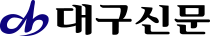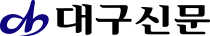어린 시절에 본 것이 단순히 두 눈으로 본 사실만을 말한다면 어른이 되어서 본다는 것은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본다는 의미가 아닐까. '내가 봤어요.'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의 보습을 바라보며 어른인 난 어떤가. '내가 본 것이 정말 내가 아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본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터키의 작가 오르한 파묵(1952~)은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본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가 말해주듯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상을 보다 더 폭넓게 보려면 좀 더 오랜 시간 깊이와 성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래전, 등단하고 인사차 선생님을 찾아갔던 때가 떠오른다. 함께 축하하고 차를 나누기로 마련한 자리였다. 글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선생님의 표정이 일순 굳어지더니 어렵게 해야 할 말이 생각났다는 듯 어색한 웃음으로 운을 띄웠다. '상처받지 말기를' 돌다리 두드리듯 몇 번이나 되묻고는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만지작거리던 말이라며 조심스레 꺼내 든다.
당선소감문에 대해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는 것이다. 소감문 속, 생각지도 않은 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줄타기했다는 것이었다. 일명 잘 나간다는 유명시인의 이름을 올려 나의 잇속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나는 되물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뒷담 화하는 그들을 선생님은 얼마나 깊이 신뢰 하시느냐'고. 대답 대신 선생님은 나에 대해 변명을 하느라 애먹었다며 덧붙인다.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은데 선생님은 나를 얼마나 깊이 아시기에 책망을 해야 할 그들에게 오히려 변명했다고 하는지.'
그 후, 며칠간을 내내 그 말에 갇혀 지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으나 글을 쓰지 못했고 물만 먹어도 목구멍에 얹혀 소화제를 먹어야 했다. 깨어 있기 위해 수십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도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런 나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소감문 속 유명시인이 '향수'와 '좀머씨 이야기'로 잘 알려진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단편소설집「깊이에의 강요」를 읽어보길 권했다. '신경 쓸 것 없어요. 시인은 너머를 보는 사람이죠. 모든 걸 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젊은 여인은 초대 전시회에서 어느 평론가로부터 "그 젊은 여류 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작품들은 첫눈에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사람들은 비평을 외우고 있는 듯이 연신 말을 꺼내고 다니며 등 뒤에서 나지막이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는 것이 사실인 양 떠들고 다니게 된다. 형체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말에 사로잡힌 그녀는 그림에는 손도 대지 않으며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림 그리길 시도해 보지만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를 외치며 실패하게 된다.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앞에서 불쑥 '실례지만, 이 그림에 깊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물었다가 크게 비웃음을 사고 만다.
한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던 젊은 여인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외출도 하지 않고 방문도 받지 않으며 몸은 점점 비대해졌다. 알코올과 약물복용으로 연명하며 보내던 그녀는 결국, 텔레비전 방송 송신탑으로 올라가 139미터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깊이 침몰하고 만다. 가늠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깊이로 인해 결국, 보이는 세상의 깊이에 맞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더 깊은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고 만 셈이다. 그녀가 끔찍하게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하는 단평을 문예란에 기고한 평론가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듦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인,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에의 강요를."
오다가다 몇 번 섞인 눈인사로는 상대의 깊이를 알 수 없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어진 상황을 이겨 낼 힘 또한 길러야 하지 않을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외부의 평가로부터.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