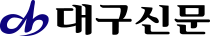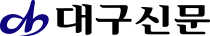조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다. 이 부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아주 귀하고 값진 병풍을 만들었다. 아주 구하기 어려운 천년 묵은 향나무로 병풍의 테를 만들고, 병풍의 면은 당시에 가장 좋다는 중국산 비단으로 만들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향나무 비단 병풍에 글을 넣는 것이었다. 이 부자는 이 귀한 병풍에 걸맞은 글을 넣어줄 명필가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명필가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이 집을 찾아왔다. 꾀죄죄한 옷차림의 이 사람은 유랑 길에 이 마을을 지나다가 소문을 듣고 `귀한 병풍을 구경이나 한번 하고 싶어서 왔노라’고 말했다.
부자는 이 사람의 점잖은 태도를 보고 잘 대접했다. 그런 다음 병풍을 내보이며, 손님에게 글을 부탁했다. 그는 몇 차례 완곡하게 사양했지만, 부자는 그럴수록 더욱 더 이 흔치않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게다가 손님이 사양하는 것을 보고 겸손한 그의 자세에 더욱 더 믿음이 가 간곡하게 매달렸다.
“이렇게 외딴 마을에 선생 같은 명필가를 다시 모시기도 어려운 일이니, 부디 사양 마시고 저의 청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허, 낭패로고. 글씨란 자고로 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 나오는 법인데, 제가 지금 오랜 유랑 길에 기가 피폐해져 붓을 들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불편하시더라도 저의 집에 며칠 쉬시면서 기력을 회복한 다음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손님은 부잣집에서 며칠 묵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명필은 커녕 평생 붓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거렁뱅이나 다름없는 나그네였다. 무슨 일거리나 없나 기웃거리다가 마침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도 배가 고파서 이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거나하게 한 상을 얻어먹고 도망하려던 것이 그만 일이 복잡하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나그네는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며칠 묵으며 도망칠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그러나 일이 여의치 않았다. 좋은 글을 받기위해서는 명필가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 부자는 늘 그의 주변을 직접 챙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그동안 나그네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융숭하게 대접받았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니 지옥이었다.
결국 부자에게서 병풍을 받아든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말했다. “좋은 글씨란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이니, 제 주변에 사람이 얼씬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기회를 봐서 도망치려고 한 방편이었지만, 부자는 그가 기거하는 방 주변에만 사람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했을 뿐, 그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만한 곳에는 하인배들을 배치해 그의 심기를 살폈다.
이젠 꼼짝없이 맞아 죽게 생겼다고 생각한 그는 벽장에서 병풍을 꺼내 놓고 마주 앉았다. 그러기를 며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병풍만을 마주한 채 그는 길게 탄식을 했다. “내가 평생 흰쌀밥에 고깃국 한 번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은 풀었으나, 내가 맞아죽게 생겼구나. 사실을 말해도 맞아 죽을 것이고, 붓을 들어도 맞아 죽겠구나.”
결국 갈 때까지 가보자고 생각한 그는 예전에 어깨너머로 본 모습을 떠 올리며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또 며칠, 이젠 정성을 다해 차려온 진수성찬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부자는 글쓰기에 임하는 그의 자세에 감탄과 존경을 금할 수 없었다. 부자가 여기 저기 수소문해 구해온 붓을 고르는 데도 며칠이 걸렸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몸이라도 깨끗이 해두고 싶어 목욕물을 청했다.
부자는 감격했다. “역시, 명필가란 재주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목욕재계를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까지 필요한 거야.” 드디어 나그네가 며칠을 갈아놓은 먹물에 붓을 듬뿍 찍은 것은 삼경도 지난 야심한 시각이었다. 그의 이마에선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머리에선 뜨거운 김이 서려 올랐다. 그는 하늘을 향해 길게 탄식하곤 향나무 비단 병풍에 붓을 올렸다.
그리고는 필생의 염을 다해 붓을 길게 내려 그었다. 그때 갑자기 마른하늘에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렸다. 붓에다 필생의 염과 한을 다 쏟은 탓인지,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다음 날 사태를 파악한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귀한 병풍을 버려놓은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애매한 송장까지 치게 되었던 것이다. 화가 난 부자는 병풍을 헛간에다 처박아 넣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양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고, 고을원님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그의 집으로 손님을 모셨다. 마침 손님 중에는 덕이 높은 학자와 당대의 명필가도 있었다. 부잣집에 들어 선 학자는 주인에게 헛간을 가리키며 뭐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헛간이라는 대답을 들은 그는 강한 기가 피어오르는 헛간을 보여 달라고 했다.
마침내 헛간 구석에서 병풍을 발견한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병풍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다가가서 병풍을 보던 명필가는 감탄했다. “내 태어나 이렇게 힘찬 필체는 처음 보오.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소이다.” 학자와 명필가의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그 병풍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제서야 학자와 명필가는 병풍에 서린 기운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그 한 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