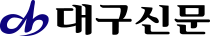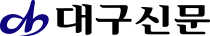여기에 추가된 곳이 대장동이다. 우리 같은 벽창호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살지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훤히 꿰뚫고 있었다. 1만 원 대로 거래되던 땅값이 몇 백만 원으로 치솟았어도 살 방법이 없다. 성남개발공사가 설계하고 화천대유가 개입한 민관공동개발로 프레임이 짜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측에서 가장 많은 배분을 받는 게 정상인데 대장동의 경우에는 불과 3억5천만 원을 투자한 민간건설업자가 4040억 원의 배당금과 3000억 원의 분양이익금으로 돈벼락을 맞았다. 화천대유(火天大有) 천화동인(天火同人)이라는 회사명이 주역(周易)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검찰에 소환된 대주주 김만배의 성명 세자를 보고 나는 무릎을 쳤다. 金은 성으로 쓸 때에만 김으로 읽고 다른 의미로 쓸 때에는 금으로 읽는다. 금(金)은 수천년래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화폐가치다. 그의 이름은 만배다.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성철스님도 3천배만 알았지 만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름에 절 배(拜)자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른 한자를 썼겠지만 金에 딱 어울리는 만배는 萬倍다. 대장동에서는 과연 ‘만배’가 불어났을까.
대장동사건은 몇 사람의 기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이 맨 처음 파헤쳤다고 한다. 요즘 종이 신문은 잘 팔리지도 않고 독자도 현저히 감소되었다. 스마트폰에 범람하는 통에 포털뉴스가 판을 치지만 아무나 신고만 하면 등록이 되는 인터넷신문은 한두 사람이 기자 겸 편집발행인으로 활동한다. 대장동을 파헤친 기자 5명의 이 신문은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는 큰 공을 세웠다. 메이저신문과 방송들이 전면을 할애한 대서특필로 연일 화제를 뿌린다. 이 사건의 중심축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이재명이다.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기획되고 설계된 사안이다.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는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사장대행을 지냈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다고 하니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곽상도의 아들이 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들춰지자 이재명은 재빨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의 순발력은 타인의 추종불허다. 곽상도는 이로 인하여 의원직까지 내던졌다. 원유철의 이름도 오르내리니 야당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유명 법조인들의 개입정황이다. 그 중에서도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은 재직 중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 최종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관철되었으며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추대되어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특검 박영수, 검사장 출신 등 유명 법조인 상당수가 이 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급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상적인 기업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상식을 벗어난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며 화천대유의 천문학적인 이익금에 보탬이 되었다면 그 내막은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야만 한다. 다만 이 사건은 이재명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재명은 현재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50%대를 넘는 압도적인 1위 후보다. 검찰로서는 매우 난감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여야가 모두 개입된 대장동게이트를 듣고 보면서 가슴 속 가득히 분통을 터뜨린다. 문재인정권은 레임덕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국민의 원성이 집합된 대장동게이트를 활짝 열어 책임을 묻는 정도(正道)를 선택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